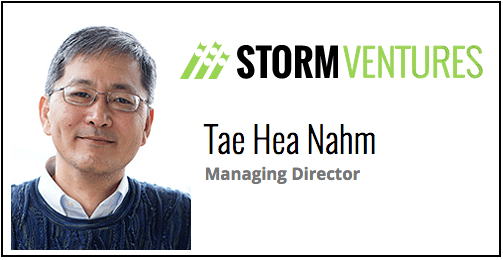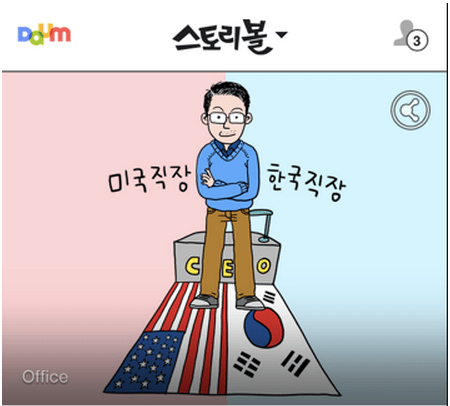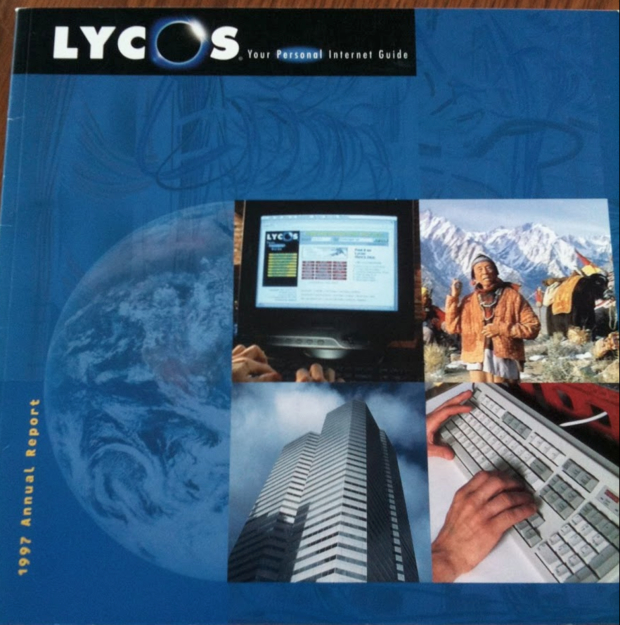Archive for 6월 28th, 2015
“회사의 진정한 문화는 보상, 승진, 해고가 결정한다”-남태희
오늘 스톰벤처스 남태희매니징디렉터(변호사)의 코너오피스 인터뷰가 뉴욕타임즈에 실렸다. 이 코너오피스는 매주 NYT일요판에서 미국의 주요 기업리더들과 문답을 통해 리더십에 대해서 탐구하는 코너다. 주옥같은 인터뷰가 많다.
마침 남변호사는 내가 실리콘밸리에 있을때 만나뵙고 대단한 내공에 감탄했던 분이다. 미국에 5살때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가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으나 실리콘밸리로 가서 결국 벤처캐피털리스트로 변신한 분이다.
인터뷰내용중 기업문화에 대한 문답이 인상적이라서 기억해두려고 번역해봤다.
질문은 “당신은 수많은 다양한 기업문화를 지켜봐왔다. 문화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오는가”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남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내게 있어서 문화란 사람들이 위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일일이 지시를 받지 않아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회사안에서 누가 승진되며, 누가 연봉을 올려받고, 누가 해고되는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CEO는 우리 회사의 문화는 이런 것이라고 공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진정한 문화는 보상(compensation), 승진(promotions), 해고(terminations)에 의해 정의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회사내의 누가 성공하고 실패하는지 관찰하면서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회사내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회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가를 보여주는 롤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회사의 문화가 형성됩니다.
“Culture, to me, is about getting people to make the right decision without being told what to do. No matter what people say about culture, it’s all tied to who gets promoted, who gets raises and who gets fired. You can have your stated culture, but the real culture is defined by compensation, promotions and terminations. Basically, people seeing who succeeds and fails in the company defines culture. The people who succeed become role models for what’s valued in the organization, and that defines culture.”
“만약 CEO가 회사의 비전선언문의 일부로서 기업문화가 어떤 것인지 공식화하고 그것이 회사의 (누가 보너스를 받고 승진하고 해고되는지에 기반한) 비공식적인 문화와 일관성을 가지고 합치된다면 최고의 기업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적인 문화와 실제 비공식문화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회사조직내에는 혼란(chaos)이 발생합니다.”
“If the C.E.O. can outline, as part of the vision statement, what the stated culture is, and if that official proclamation of culture is aligned and consistent with the unofficial culture — based on who gets raises and promotions and who gets fired — then you have the best culture. When the two are disconnected, you have chaos.”
위 글을 읽고 “과연”이라는 생각을 했다. 사장이 아무리 우리 회사의 최고 가치는 ‘청렴’(integrity)이라고 강조해도 거래처담당자에게 뇌물을 써서 높은 매출을 올린 영업담당자를 임원으로 승진시키고 보너스까지 준다고 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과연 자신들도 청렴하게 일을 하려고 할까.
어떤 회사 사장이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창의력을 존중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우리 회사는 실리콘밸리회사처럼 운영한다”고 항상 자랑하고 다닌다고 하자.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사내회의석상에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의견을 낸 사람을 강등시키고, 해고하고, 결국 예스맨만 승진시켜 자신의 심복으로 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매일처럼 리더가 창의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들 그 조직은 과연 창의성이 넘치는 문화를 갖게 될까.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회사의 문화에 맞는 인재에게 적절한 보상과 승진을 제공하고 문화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내보내거나 아예 뽑지 말아야 한다. 대내외적으로 내세우는 문화와 실제 인사가 일치해야 한다. 지향하는 문화와 실제 조직내 인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한다. 사실 우리는 전국민이 그것을 매일처럼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라이코스이야기 1] 매니저들과 저녁 같이 먹기
내가 보스턴인근 월쌤(Waltham)에 위치한 라이코스의 CEO로 발령을 받은 것은 2009년 2월이었다. 2008년말 리먼브라더스가 붕괴하면서 전세계에 금융위기가 도래해 세상이 얼어붙은 때였다. 미국의 실업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상승하던 때였다.
미국 유학 경험은 있지만 미국직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은 없었던 나로서는 이런 암울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미국인들 80여명으로 구성된 회사를 끌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됐다. 더구나 10여명을 구조조정으로 내보내는 와중이어서 직원들은 혹시 자기도 잘릴 수 있다는 공포심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었다. 사무실을 걸어 다니다 보니 PC화면에 이력서를 띄우고 다듬고 있는 직원들도 보일 정도였다. 후일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회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회사의 문을 닫으러 온 것이라고 믿는 직원들도 많았다.
직원들과 친밀해지기 : 차 한잔하면서 담소.
어떻게 하면 나를 저승사자로 대할 직원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내가 택한 방법은 1:1 면담이었다. 한 사람당 30분씩 최대한 시간을 내서 차 한잔을 놓고 만나서 이야기했다. 일단 아무 얘기나 하다 보면 친밀감이 형성될 것 아닌가. 직원들도 새로운 CEO가 뭔가 들으려고 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2002년 MBA졸업후 7년동안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어서 도대체 영어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영어도 늘었다. 하루에 몇명씩이라도 부지런히 이렇게 대화를 했더니 한달이 지나니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과 안면을 틀 수 있었다. 심지어 어떤 인도계 직원은 “이 회사에 10년을 다녔는데 CEO와 직접 1대1로 이야기해본 것은 처음”이라며 지나치게 흥분해 당황하기도 했었다.
물론 뒤숭숭한 상황에서 본사에서 온 CEO에게 처음부터 친밀하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설사 있었다고 해도 돌이켜보면 다 살아남기 위해서 내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래도 이렇게 이름과 얼굴을 익혀 놓으니 서로 휠씬 대하기가 편해졌다.
직원들과 친밀해지기 : 같이 점심 먹기
그리고 점심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두 명씩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다. 사람은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쉽게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이었다. (혼자 밥을 먹지 않는 것은 기자시절부터 베인 버릇이다.) 미국사람이라고 그게 다르겠냐 싶었다. 그리고 밥을 같이 먹고 내가 돈을 내면 고마워하고 기뻐했다. (물론 이것은 회사비용으로 했다.) 사장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꼭 사장이 자신 몫까지 계산해 줄 것이라고 생각 않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웬만하면 윗사람이 밥값을 내는 한국식 문화를 적용한 결과 많은 직원들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내 점심시간은 하루에 한번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모든 직원들과 밥을 먹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일단은 매니저급부터 같이 식사하기 시작했다. (1년쯤 지나니까 거의 전 직원과 점심을 한번씩은 따로 할 수 있었다.)
당시 나는 보스턴에 단신 부임이었다. 가족들은 몇 달 뒤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회사 바로 앞에 있는 Extended Stay America라는 모텔에 장기 투숙중이었다. 보스턴에는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회사에 나가는 것 외에는 할 일도 없었고 쓸쓸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직원들과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부족한 내 영어 실력을 보완하는 영어 회화 연습 시간이라고 위안을 삼기도 했다.
한국식 친밀해지기 : 저녁 약속
그런데 문제는 저녁시간이었다. 5시에서 6시사이에 직원들은 거의 다 집에 가버리는데 나는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다. 모텔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사온 3분카레나 컵라면을 먹기도 했는데 그것도 조금 지나니 질렸다. 저녁 6시이후에는 사무실에 별로 사람이 없고 모텔방은 빛이 잘 안드는 골방같은 곳이어서 있기가 싫었다. 그래서 주요 매니저들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물어보기 시작했다.
미국의 패밀리 타임
그런데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더니 몇몇 매니저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단박에 OK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와이프에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는 답이 많았다. 아니 그걸 왜 와이프에게 물어보지? 이 사람들 알고 보니 공처가들이구나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 2주일 정도 거의 매일 저녁시간에 매니저들을 데리고 저녁을 먹었다. 맥주 한두 잔을 곁들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건 점심과 달리 별로 호응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았다. 이래저래 집에 일이 있다고 변명을 하면서 빼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워진 매니저에게 저녁을 하면서 진심을 물어봤다. 그 친구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
그 친구왈 “여기서는 웬만하면 모두 점심약속으로 하지 저녁약속을 하는 경우는 없다. 비즈니스 때문에 저녁을 하는 경우는 거래처 사람이 출장을 와서 계약을 하거나 하는 중요한 경우에 한하지 웬만해서는 저녁약속을 잘 잡지 않는다. 특히 결혼한 기혼자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한국 모회사에 낙하산으로 온 저승사자 같은 사장이 “저녁 먹자”하니까 내키지 않으면서도 따라 나온 것이었다. 사장이 저녁 먹자고 하면 있는 약속도 취소하고 따라오는 한국식 문화에 익숙해진 나의 실수였다.
1년쯤 지나서 휠씬 친밀해진 HR(인사) 담당 매니저 존과 그때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그 존은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저녁은 가족과의 시간(패밀리타임)으로 간주하며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저녁시간을 내달라고 회사에서 요구 못한다.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면 배우자에게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걸 모르고 실수한 것이라고 따끔하게 한마디했다.
자기가 좋아서 회사에 남아있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회사에서 직원에게 패밀리 타임을 건드리면서까지 회식(?) 등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계기였다.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많이 출장을 다녔지만 미처 몰랐던 것이었다. 항상 상대방에게 시간을 청할 때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시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미국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 너무 바쁘게 사는 한국인은 여기에 너무 무감각해진 듯 싶다.
[라이코스 이야기] 연재를 시작하며
2013년 8월 다음의 임선영본부장에게 “스토리볼에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대표 글을 싣고 싶은데 소개 좀 부탁한다”는 메일을 받았다. 알았다고 하자 “정욱님도 한번 써보시면 어떠냐”는 답장을 받았다. 그것이 계기가 되서 가볍게 10편정도 라이코스에서의 경험을 써보려고 했던 것이 ‘한국 vs 미국직장 1mm 차이‘ 스토리볼 연재가 됐다. 10편에서 20편, 20편에서 30편까지 연장하며 매주 2편씩 쓰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다. 급히 쓰느라 엉성하게 쓴 글이 대부분이었는데 편집자인 민금채님의 노력과 감칠맛 나는 박소라님의 일러스트 덕분에 분에 넘치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
***
나는 2009년 2월 역시 다음CEO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최세훈대표로부터 라이코스CEO 발령을 받았다.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나를 2006년 다음으로 인도한 석종훈대표의 사임이후 내 다음내부에서의 진로에 대해 “그만둬야 하나”하는 고민을 하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다음에서 서비스혁신본부장, Daum Knowledge Officer, 대외협력본부장을 거쳐 글로벌센터장을 맡고 있었다. 글로벌이라고 해도 당시 다음은 일본과 중국지사를 닫고 라이코스는 경영난에 빠져있는 상황이라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따로 면담 몇번 한 것이외에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최대표가 나를 라이코스대표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다음이 2004년 당시 1억불을 주고 인수한 라이코스는 다음에게 있어 애물단지나 다름 없었다. 매년 수백만불의 적자를 내면서 네이버와의 경쟁에 힘겨워하는 다음의 뒷다리를 잡았다. 한국에서 직항편도 없는 보스턴에 위치한 회사를 원격으로 다음이 경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미국동부와 서울의 시차가 14시간이 나고 서로 업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탓에 양사의 커뮤니케이션조차 쉽지 않았다.
2008년 가을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붕괴이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당시 분위기는 흉흉했다. 미국의 실업율은 두자리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내가 라이코스 발령을 받은 당시에도 라이코스 직원 20여명을 구조조정하는 논의를 진행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코스에 CEO로 가는 것 자체가 사실 두려운 일이었다. MBA학위를 받기 위해 미국에서 2년간 유학한 것 외에는 미국에서 제대로 일해본 경험이 없는 내가 과연 미국 회사를 맡아서 꾸려갈 수 있을까. 더구나 나를 도와주는 다른 한국인직원과 팀으로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홀로 가는 단신부임이었다.
당시 다음의 윤석찬님은 “정욱님,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죠? 구조조정하고 회사 문닫으러 가시는 것인가요”라고 내게 이야기했을 정도였다. 그래도 나는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한번은 더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잘 된 것 아닌가. 실패해도 최소한 영어회화 수업은 잘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좀 유치한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라이코스 CEO로서 지난 3년간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었다. 경영상황은 호전됐지만 그안에서 여러가지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다. 대충 3년간 벌어진 주요한 일은 다음과 같다.
2009년
- 20여명 구조조정.
- 4가지 큰 법률소송중 3개는 합의. 1개는 패소. 2백50만불을 배상.
- 15년 라이코스 역사상 첫 흑자 달성. (매출 약 2천4백만불 EBITDA 약 50만불)
2010년
- 라이코스를 인수하겠다는 Ybrant라는 인도회사와 회사 매각협상 진행.
- 옐로북과 연간 1천2백만불 매출 계약 체결.
- 라이코스를 3천6백만불(4백20억)에 Ybrant로 매각 발표.
- Ybrant는 인수대금을 현금으로 2백만불만 지불.
- 나머지 인수대금은 라이코스의 2010년 경영성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Earnout딜)
- 라이코스를 인수한 Ybrant 이스라엘 자회사의 지휘하에 라이코스 경영 시작.
- 8백여만불 흑자 달성. (매출 약 2천9백만불)
2011년
- 회계감사 결과 2010년의 예상보다 높은 흑자로 최종인수가가 약 600억여원가량으로 산출.
- 매각발표금액보다 약 200억원이 더 높은 가격.
- Ybrant와 다음간에 최종 인수가 관련한 분쟁이 갈등이 발생.
- 다음이 Ybrant를 뉴욕법원을 통해 소송.
- 다음은 Ybrant가 라이코스의 현금을 마음대로 빼갈 수 없도록 TRO(일종의 가처분조치)를 뉴욕법원에서 받아냄.
2012년.
- Ybrant는 2월에 급거 이사회를 소집해 임정욱 CEO를 해임.
이후 2년간의 지리한 법정공방후 2014년 5월 싱가폴에서 열린 중재재판에서 다음은 Ybrant에게 99.9% 승소했다. 하지만 밀린 매각대금 4백여억원은 아직도 못받고 있다.
어쨌든 라이코스CEO로 재직한 3년간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미국회사를 경영하는 것 외에도 미국인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미국이라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사실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이 많았다. 간신히 회사의 경영이 호전되고 있을때 보스턴 법원에서 소송에 패소해서 3백만불을 배상하라는 뉴스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한달이면 끝날줄 알았던 회사의 매각 협상이 거의 반년을 이어갈 때는 정말 지쳤다. 회사 매각후 엄청나게 터프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더구나 알고보니 그들이 엉터리 회사였고 그나마 경영이 호전되고 있었던 라이코스를 말아먹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때는 절망적이었다. 갈등이 있었던 임원 때문에 온갖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 해고하는 일도 정말 어려웠다. 인터넷회사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다. 그리고 분쟁이 붙은 다음과 Ybrant의 중간에서 라이코스를 중립적으로 경영하던 반년간은 바늘방석에 있던 것 같았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갑자기 해고해줬을때 후련한 마음이 들었다고 할까.
스토리볼 덕분에 이런 내 경험의 일부나마 나눌 수가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다. 하지만 스토리볼에 썼던 내용은 대부분 가벼운 한미간의 직장 문화차이에 대한 글이나 좋았던 일을 중심으로 썼다. 힘들었던 일, 후회되는 실수 등은 쓰지 못했다. 그래도 라이코스에서 경험한 일들을 추가로 더 써놓을 수 있을때 나를 위해서라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스토리볼 연재내용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내 블로그에 ‘라이코스 이야기’를 남겨놓으려고 한다. 항상 부족한 글이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주시길….